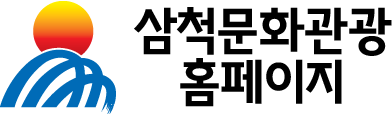삼척의 음식이야기
곰치국이란?
다른 고장에서는 물메기로 불려지기도 하는 곰치는 동해안의 것이 살이 더 부드럽고 담백하다.
잘 묵은 김치와 함께 푹 끓여낸 곰치 해장국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입안에서 살살 녹으며 삼척이 원조로 유명하다.

역시 생선 곰치의 이름도 그 생김새를 보고 붙여진 것이다.
곰치를 실지로 본일이 있는가?
입이 뭉퉁하게 생긴데다가 물컹물컹한 살을 만져보면 도시사람들은 "아이구 징그러워라." 하고 뒤로 물러날것이다.
옛날 고기잡이배에 큰곰치가 걸리면 "재수 없게 제삿상에도 못오르고, 값도 없는 이놈의 곰치가 그물 찢어지게 왜 이리 걸렸나?" 하고 나룻가에 버렸다고 한다.
특히 곰치가 많이 잡히는 겨울철에는 한푼 벌어보려 하는 가난한 바닷가 아낙들이 그 흐물흐물한 고기를 주워 실고 인근의 5일장이나 인근 마을 집집 찾아다니며 "곰치 사요! 곰치 사요!" 하고 소리 치며 돈 몇푼에 곰치를 푸짐하게 넘겨주었다.
가자미. 대구, 송어, 명태, 열기, 문어처럼 제사상에 오르는 귀한 고기들이야 말로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가리지 않고, 일년 제삿날에 맞춰서 준비해 두는 것이었지만 곰치는 버리느니 아까워서 거둬 먹는 생선이었다.
지금은 곰치 두 세토막 넣은 곰치국 한그릇이 12,000원이라도 먹기 어려운 음식이 되었지만 바닷가 인근의 가난한 아낙들은 싸구려 곰치를 잔뜩 사서 일단 묵은 김치 넣고 곰치국을 끓여먹었는데 곰치는 끓여도 살이 흐물흐물해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만 했다.
국 끓여먹고 남은 고기는 훌러덩 껍데기를 벗겨서초가집 처마밑에 널어서 꾸덕꾸덕하게 말렸다.
초겨울 김장철이 되면 그 꾸덕꾸덕한 곰치고기를 김장에도 넣었고 솥에다 쪄서 간식거리나 밥반찬으로 했고 그 맛에 싫증 나면 갖은 양념을 해서 졸여먹기도 했다.
그나마 먹다가 물려서 그냥 처마밑에서 빠짝 말라버린 곰치는 마치 명태포나 마른 오징어처럼 맛있는 간식이 되거나, 농사일에 지친 아버지들이 거친 막걸리 한잔을 들이킬 때 좋은 안주거리가 되어 주었다.
그렇게 흔하던 곰치의 이야기는 이미 40년 전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kbs,mbc, sbs, ytn등 각종 tv매체들뿐 아니라 각종 일간지에 소개됨으로 해서 일약 삼척의 대표음식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유명해 지다보니 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공급이 딸릴 수밖에...
한정된 바다의 수산자원인 곰치가 너무 인기가 높다보니 곰치기 바다에서 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줘도 먹지 못하는 귀한 음식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곰치는 냉동을 하면 그 맛이 사라지니 저장도 할 수없단다.
그러니 지금의 곰치값이 하늘을 치솟는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가?
수산자원 증식에 따라 인공양식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다시 흔하게 곰치를 만날 날이 언제가 될까?

- 페이지담당 :
- 관광정책과 ( 033-570-3077 )
- 최종수정일 :
- 2023-01-04 11:56:40